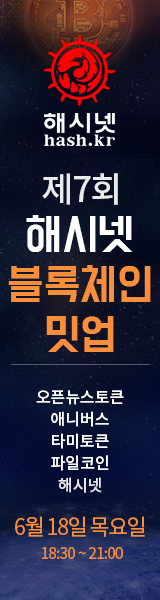금속화폐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개요 == | == 개요 == | ||
| − | [[파일:명도전.jpg|썸네일|200픽셀|명도전 | + | [[파일:명도전.jpg|썸네일|200픽셀|명도전]] |
금속화폐는 금화·은화·동화·철화 등이 만들어졌다.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금속화폐는 금속 자원의 채굴량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광산이 고갈되면 화폐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기도 했다. 금속화폐의 부족 현상은 수표·환전어음·[[지폐]] 등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처음에는 지금(地金 : 제품으로 만들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을 계량하여 사용했는데, 이를 '칭량화폐'(秤量貨幣 : 중량을 재서 그 교환 가치를 헤아려 쓰던 화폐)라 한다. 이후 이것이 주조화폐(鑄造貨幣)가 되었다. 이처럼 일정한 형상이나 중량을 가진 화폐를 계수화폐(計數貨幣)라 한다. 지중해나 서유럽에서는 주로 금속을 사용했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동(銅)을 주로 활용하였다. 서유럽에서는 영주나 상인의 교역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중국에서는 농민의 지역시장에서의 교환 용도로 쓰였다. 한국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금속화폐는 BC 6세기경의 [[명도전]](明刀錢)이 있고, 한국 최초로 주조된 금속화폐는 고려 성종 때 철전(鐵錢)인 [[건원중보]](乾元重寶)가 있다. | 금속화폐는 금화·은화·동화·철화 등이 만들어졌다.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금속화폐는 금속 자원의 채굴량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광산이 고갈되면 화폐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기도 했다. 금속화폐의 부족 현상은 수표·환전어음·[[지폐]] 등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처음에는 지금(地金 : 제품으로 만들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을 계량하여 사용했는데, 이를 '칭량화폐'(秤量貨幣 : 중량을 재서 그 교환 가치를 헤아려 쓰던 화폐)라 한다. 이후 이것이 주조화폐(鑄造貨幣)가 되었다. 이처럼 일정한 형상이나 중량을 가진 화폐를 계수화폐(計數貨幣)라 한다. 지중해나 서유럽에서는 주로 금속을 사용했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동(銅)을 주로 활용하였다. 서유럽에서는 영주나 상인의 교역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중국에서는 농민의 지역시장에서의 교환 용도로 쓰였다. 한국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금속화폐는 BC 6세기경의 [[명도전]](明刀錢)이 있고, 한국 최초로 주조된 금속화폐는 고려 성종 때 철전(鐵錢)인 [[건원중보]](乾元重寶)가 있다. |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 '''[[인도]]''' : 기원전 7세기경부터 칭량화폐가 사용되어 기원전 5세기에는 타인화폐(打印貨幣)인 은화가 등장했다. 이후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경화가 사용되었는데, 1바나 은화가 16마사카 동화로 교환되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그리스인에 의해 그리스 양식의 경화가 발행되고 인도의 경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후 쿠샨 제국의 카니슈카는 로마 아우레우스 금화 양식의 금화를 만들기도 했다. | * '''[[인도]]''' : 기원전 7세기경부터 칭량화폐가 사용되어 기원전 5세기에는 타인화폐(打印貨幣)인 은화가 등장했다. 이후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경화가 사용되었는데, 1바나 은화가 16마사카 동화로 교환되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그리스인에 의해 그리스 양식의 경화가 발행되고 인도의 경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후 쿠샨 제국의 카니슈카는 로마 아우레우스 금화 양식의 금화를 만들기도 했다. | ||
| − | [[파일:개원통보.png|썸네일|200픽셀|중국의 개원통보 | + | [[파일:개원통보.png|썸네일|200픽셀|중국의 개원통보]] |
* '''[[중국]]''' : 상나라와 주나라 때 조개나 귀갑(龜甲)이 화폐로써 사용되었고, 춘추 시대에는 이를 본뜬 모양의 동패(銅貝), 도전(刀錢), 포화(布貨)가 만들어졌다. 전국 시대에는 주화(鑄貨 : 쇠붙이를 녹여 만든 화폐)가 보급되었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는 도량형이 통일되어 동전인 반냥전(半兩錢)을 경화로 사용했다. 진한교체기에는 금화나 동화, 포백(布帛)이 화폐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전한이 건국된 뒤에는 오수전(五銖錢)이 발행되었다. 신나라 때 동(銅)이 부족해 화폐경제가 혼란해졌는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보화제(寶貨制)를 실시했으나 실패하고 곡물의 가격만 급등하였다. 후한 말기에 동탁은 오수전을 동탁소전(董卓小錢)으로 개주(改鑄)했는데 명문(銘文)이나 연마(硏磨)가 되어있지 않은 악화였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오수전이 계속 발행되었지만 동(銅)의 부족은 해소되지 않아 동전이 부족해지게 되어 철편(鐵片)이나 종이를 겹치는 등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당나라가 개원통보(開元通宝)를 발행하기까지 지속되었다. | * '''[[중국]]''' : 상나라와 주나라 때 조개나 귀갑(龜甲)이 화폐로써 사용되었고, 춘추 시대에는 이를 본뜬 모양의 동패(銅貝), 도전(刀錢), 포화(布貨)가 만들어졌다. 전국 시대에는 주화(鑄貨 : 쇠붙이를 녹여 만든 화폐)가 보급되었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는 도량형이 통일되어 동전인 반냥전(半兩錢)을 경화로 사용했다. 진한교체기에는 금화나 동화, 포백(布帛)이 화폐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전한이 건국된 뒤에는 오수전(五銖錢)이 발행되었다. 신나라 때 동(銅)이 부족해 화폐경제가 혼란해졌는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보화제(寶貨制)를 실시했으나 실패하고 곡물의 가격만 급등하였다. 후한 말기에 동탁은 오수전을 동탁소전(董卓小錢)으로 개주(改鑄)했는데 명문(銘文)이나 연마(硏磨)가 되어있지 않은 악화였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오수전이 계속 발행되었지만 동(銅)의 부족은 해소되지 않아 동전이 부족해지게 되어 철편(鐵片)이나 종이를 겹치는 등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당나라가 개원통보(開元通宝)를 발행하기까지 지속되었다. | ||
| − | * '''[[그리스]]''' :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는 경화가 급속도로 퍼졌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경화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리디아 왕국에서 사용한 호박금으로 이는 그리스에도 영향을 주어 기원전 650년경 아르고스에서 은화가 만들어졌으며, 기원전 550년경에는 리디아 호박금에서 분리된 금화를 바탕으로 타소스섬에서 금화가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스파르타나 아르고스에서 철화가 사용되었으며, 기원전 6세기가 되면 경화가 에게해(Aegean Sea) 일대에서 널리 이용하게 되었다. 폴리스들은 각각 상이한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로 인해 환전상들은 재산을 축적해 나갔으며, 이것을 대부에 활용했는데 이것이 은행의 기원이다. 기원전 5세기, 아테나이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번성하여 | + | * '''[[그리스]]''' :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는 경화가 급속도로 퍼졌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경화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리디아 왕국에서 사용한 호박금으로 이는 그리스에도 영향을 주어 기원전 650년경 아르고스에서 은화가 만들어졌으며, 기원전 550년경에는 리디아 호박금에서 분리된 금화를 바탕으로 타소스섬에서 금화가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스파르타나 아르고스에서 철화가 사용되었으며, 기원전 6세기가 되면 경화가 에게해(Aegean Sea) 일대에서 널리 이용하게 되었다. 폴리스들은 각각 상이한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로 인해 환전상들은 재산을 축적해 나갔으며, 이것을 대부에 활용했는데 이것이 은행의 기원이다. 기원전 5세기, 아테나이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번성하여 드라크마를 비롯한 그리스의 은화가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릭, 키지코스의 호박금과 함께 거래에 사용되었다. |
| − | * '''[[로마]]''' : 고대 로마제국에서 사용된 최초의 화폐는 청동화폐인 | + | * '''[[로마]]''' : 고대 로마제국에서 사용된 최초의 화폐는 청동화폐인 아스로인데, 그리스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로마는 그리스의 영향으로 은행제도를 지역 거래를 위해 환전을 시행했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금은복본위제가 시행되어 은화인 [[데나리우스]]는 98%의 은을 함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우렐리아누스 당시 질이 떨어져 함유율이 3%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
=== 중세 === | === 중세 === | ||
| 34번째 줄: | 34번째 줄: | ||
* '''[[스페인]]''' : 스페인 카스티야 왕국은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양의 은을 확보하여 16세기에 이스쿠두 금화나 레알 은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자리잡았다. 은의 유입으로 가격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다. 각국의 상인들이 안트베르펜에 모여 국제 금융의 중심되이 되기도 하였다. | * '''[[스페인]]''' : 스페인 카스티야 왕국은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양의 은을 확보하여 16세기에 이스쿠두 금화나 레알 은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자리잡았다. 은의 유입으로 가격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다. 각국의 상인들이 안트베르펜에 모여 국제 금융의 중심되이 되기도 하였다. | ||
* '''[[중국]]''' :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건국되기 전부터 은화의 발행이 시작되었으나 동이 부족하여 동화가 무역용 화폐로 사용되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채굴]]된 무역은(銀)은 스페인의 갤리온 무역에 의해 태평양을 경유하여 중국에 도달했고, 명나라는 은의 교역권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명나라에서 은화와 지폐가 화폐로써 정착하여 동화의 발행이 쇠퇴하고 명일무역도 끊겨 일본으로의 동화 유입이 사라졌다. | * '''[[중국]]''' :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건국되기 전부터 은화의 발행이 시작되었으나 동이 부족하여 동화가 무역용 화폐로 사용되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채굴]]된 무역은(銀)은 스페인의 갤리온 무역에 의해 태평양을 경유하여 중국에 도달했고, 명나라는 은의 교역권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명나라에서 은화와 지폐가 화폐로써 정착하여 동화의 발행이 쇠퇴하고 명일무역도 끊겨 일본으로의 동화 유입이 사라졌다. | ||
| − | [[파일:상평통보.jpg|썸네일|200픽셀| | + | [[파일:상평통보.jpg|썸네일|200픽셀|상평통보(常平通寶)]] |
| − | * '''[[한국]]'''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 + | * '''[[한국]]'''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화폐인 상평통보(常平通寶)가 있었다. 1633년(인조 11) 부터 유통을 시도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유통을 중지했다. 하지만 그후 1678년(숙종 4) 정월에 다시 허적, 좌의정 권대운 등의 주장에 따라 상평통보를 다시 주조하여 서울과 서북 일부에 유통하게 되었다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유통되었다. 조선 말기에 현대식 화폐가 나올 때까지 약 200년 동안 통용되었다.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화폐 역사상 전국에서 사용된 최초의 동전이라 볼 수 있다. 상평통보의 단위는 1문(푼)이라 했는데, 10푼이 1전, 10전이 1냥, 10냥이 1관이었고, 관이 최고 단위였다. 조선 후기의 1냥은 약 2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 처음 상평통보가 나왔을 때, 백성들은 조그만 동전으로 쌀이나 옷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 사용하기를 꺼려 했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의 벌금을 상평통보로 받았다. 이로 인해 18세기 후반부터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되었다. |
:{|border=2 width=600 | :{|border=2 width=600 | ||
| 67번째 줄: | 67번째 줄: | ||
* 내구성이 있음 | * 내구성이 있음 | ||
* 휴대가 편리 | * 휴대가 편리 | ||
| − | |||
| − |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