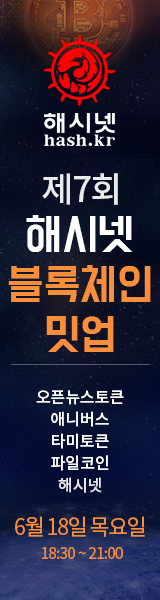해제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 해제권 == | == 해제권 == | ||
| − | + | 당사자에 의하여 형성된 계약관계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에게 정당한 [[해제권]]이 제공된다. 여기에는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이 있으며 후자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해제권의 발생원인과 그 효과를 미리 유보하는 경우로서 그 행사 및 효과는 법정해제와 다를 바 없다. 약정에 의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며 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법정해제권은 모든 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법 제544조 ~ 제546조에 따르면 각종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 |
| − | === | + | === [[약정해제권]] === |
| − | [[약정해제권]] | ||
| − | === 법정해제권 === | + |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해제로서, 그 해제권 발생의 원인이 당사자의 계약에 기하는 것을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이라 한다. 그 적절한 예로서는 매매계약에서 볼 수 있는 계약금(契約金)이 있고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의 환매(還買) 등이 있다. 또 예를 들면 A로부터 3천원에 가방을 사는 계약을 체결한 B가 계약금으로 300원을 A에게 건넸다고 하면 매수인 B는 300원을 포기함으로써 또는 매도인 A가 배액인 600원을 B에게 상환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혹은 A가 300만원의 금전 때문에 자기 집을 파는 계약을 B와 체결한 경우, 10년 후에 환매하기로 특약을 맺어 놓았다고 한다면 매도인 A는 대금 300만원과 비용을 매수인 B에게 반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
| − | 현재 약정해제권보다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 + | |
| + | === [[법정해제권]] === | ||
| + | |||
| + | 현재 약정해제권보다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쪽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계약에서는 각기 개별적으로 해제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매매에서는 570조, 578조, 580조, 도급에서는 668조, 673조 등) 대체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의 행사를 법률에 의하여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방의 매매의 매도인에게 '이행지체'가 있으면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해도 가방이 도착하지 않으면 비로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 측에서도 대금채무의 제공을 해놓지 않으면 매도인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받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방은 대소(大小)가 한 조(組)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가방을 매도인이 다른 데 매각했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큰 가방에 대하여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며 작은 가방만으로는 소용이 안 되므로 대소 모두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대소 두 개가 모두 도착은 했으나 이른바 '불완전 이행'으로서 조악(粗惡)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쓸 수 없으며, 더욱이 양질(良質) 재료는 이미 품절인 경우, 추완불능(追完不能)으로서 이행불능의 경우에 준한 해제, 조악한 부분은 금속장식만으로써 교환이 가능하면 추완가능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 준한 해제가 된다. | ||
=== 정기행위의 해제권 === | === 정기행위의 해제권 === | ||
| + | |||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기가 경과하면 재촉하지 않고 곧 해제할 수 있다.<ref name="위키백과"></ref> |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기가 경과하면 재촉하지 않고 곧 해제할 수 있다.<ref name="위키백과"></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