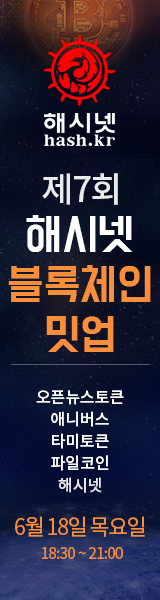총통(總統)은 국가 원수를 지칭하는 관직명이다.[1]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국가원수 혹은 정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최고 책임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정부의 영수를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다. 그 뜻은 '총괄하여 통치'. '총괄하여 처리'라는 뜻을 가진 총리보다 한 급 위다.[2]
어원은 청나라 말기에 영어인 미국 연방정부의 President를 번역한 것에서 유래한다. 원래는 프레지던트를 음차해서 '伯理璽天德(bólǐxǐtiāndé/백리새천덕)' 등으로 쓰다가 1870년대부터는 해당 영어를 총통으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총통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후 신해혁명으로 임시 대총통으로 쑨원이 선임되면서 대륙에서도 총통 직함이 쓰이게 되었다. 현재 총통이 없는 대륙 중국어에서도 总统(zǒngtǒng)은 영어 president의 번역어이고 당연히 현대 민주 국가의 '대통령(大統領)'도 중화권에서는 총통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을 중국에서는 '오바마 총통'으로 부르는 식으로, 2013년 한중정상회담의 공식 문서에 중국은 '한국 총통 박근혜 여사'라는 표현을 썼던 바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대통령을 총통(tổng thóng)이라고 부르며 일례로 구 월남의 국가 원수 직함도 실제로는 tổng thóng이었지만 현대 베트남에서 한자를 안 쓰는 데다 미국을 통해 베트남을 인식하던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직함을 대통령이라고 번역했다.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직책명이 카우디요(Caudillo)였는데 이것도 한국에서는 총통으로 번역되었다. 다만 카우디요는 피델 카스트로나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 미겔 이달고 이 코스티야 등 수많은 라틴아메리카와 필리핀 정치인, 혁명가들에게도 쓰였던 명칭이라 카우디요 전체를 총통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총통을 공식적으로 국가원수의 직함으로 쓰는 나라는 중화민국(대만)과 싱가포르가 있다. 중화민국에서는 1948년 중화민국 헌법에서 국가원수를 총통으로 명시했고 싱가포르도 공용어 중 표준중국어로는 总统이라 칭하지만 싱가포르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타밀어도 공용어인 나라다 보니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주로 '총통'보다는 President의 한국어 번역인 '대통령'으로 써 주는 편인 데다 의원내각제라 대통령의 실권이 없어 한국에서 언급해야 할 만한 경우도 적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 총통이라고 지칭하는 현대 국가원수는 중화민국 총통이 유일하다.
이탈리아에서는 베니토 무솔리니가 사실상 퓌러와 동의어인 두체 칭호를 가졌지만 군주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의 신하인 총리로 처신한 사례가 있고 21세기에도 실제로 정치체제가 비슷한 이란 같은 나라가 있긴 있다. 이란은 군주의 포지션에 있는 직책이 최고지도자(라흐바르)이며 총통 포지션에 있는 직책이 대통령직이다.[2]
중화민국의 총통[편집]
중화민국 총통(중국어 정체자: 中華民國總統)은 대통령에 해당하는 대만의 국가원수이다. 안으로는 정치적 최고책임을 부담하고 중화민국군 전 군의 통수권자이며, 밖으로는 중화민국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즉 현재 대만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실권을 가진 최고 지도자이다.
1912년~1913년에는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 1913년~1924년 중화민국 대총통, 1924년~1926년 중화민국 임시집정, 1927년~1928년에는 중화민국 육해군대원수(陸海軍大元帥), 1928년~1948년 사이에는 중화민국 국민정부 주석으로 부르다가, 1947년 12월 25일에 중화민국 헌법을 시행하면서 이전의 국민정부 주석 직책을 폐지하고, 헌법에 기초하여 총통직을 창설하여, 1948년 5월 20일에 장제스가 초대 총통에 취임하였다. 1949년 이후 중화민국의 통치 범위가 타이완 및 그 주변의 일부 도서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과 구별하기 위해 타이완 총통(중국어: 臺灣總統)으로도 종종 불린다.[3]
히틀러와 총통[편집]
다른 한자문화권에서 단순히 공화국의 국가원수를 총통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총통의 뜻이 조금 다른데 이는 일본에서 나치 독일의 수장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의 직책인 퓌러(Führer)를 총통으로 번역하면서 그를 수입해 중역한 탓이 크다. '퓌러'가 일반적인 선출직 지도자와는 역할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총통은 마치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지칭하는 명칭처럼 사용된다.
총통을 독재자를 일컫는 뜻으로 사용한 것은 의외로 오래됐다. 대표적으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3선 개헌을 강행하면서까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자 김대중이 '이번에 박정희가 다시 당선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이다.'라고 이를 비판했던 사례가 있다. 냉전이 끝나고 한중수교 직후에 중국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을 总统(총통)이라고 번역하자 한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퓌러를 원수(元首, yuánshǒu, lãnh tụ)로 번역한다.
총통의 범위를 더 좁혀서 아예 히틀러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어 대화에서 '총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히틀러 관련 주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국 한정으로 쓰이는 히틀러의 별명으로 히총통[4]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에 등장한 헤드라인 짤방에서 유래했다.
일본에서도 총통이란 단어를 남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히틀러를 총통이라고 표현한 원조 격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이를테면 진격의 거인에서는 군주와 총통이 동시에 존재하고 총통이 신하인 황당한 설정이 존재했다. 명칭 자체가 3개 병단의 총통이라 사실상 총사령관에다 초법적인 성격을 추가한 정도.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도 역시 총통은 문민통제를 받지 않고 군을 독자적으로 지휘하는 자리로 나온다. 단순히 프레지던트의 번역어였던 총통의 원 의미는 이미 사라진 상황. 종합해보면 실제 역사에서 일본 제국 시기 육군대신 정도로 묘사된다.
창작물의 총통은 서구권 언어로 번역하기 조금은 난감한 단어다. 독일어식인 Führer라고 하거나 한국어/일본어 표현을 음차해야 원래 느낌에 가까운 번역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중화권에서는 원수로 번역해야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
  이 총통 문서는 정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이 총통 문서는 정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일반 : 자연, 생물, 동물, 식물, 정치 □■⊕,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역사, 역사인물, 인간, 인체, 건강, 정신, 성격, 행동, 언어, 수학, 위키 도움말
|
|
|
| 정치
|
개표 • 개혁 • 계급 • 계층 • 공국 • 공산주의 • 공화국 • 공화정 • 공화제 • 과반수 • 구의원 • 구의회 • 국가 • 국가원수 • 국민 • 국민투표 • 국회 • 국회의원 • 군주 • 군주제 • 권력 • 권위 • 권위주의 • 권한 • 극우 • 극좌 • 낙선 • 다당제 • 다수결 • 단원제 • 당선 • 대중 • 대중민주주의 • 대통령 • 대통령제 • 대표 • 도의원 • 도의회 • 독재 • 독재자 • 만장일치 • 몰표 • 무효표 • 민의원 • 민주 • 민주제 • 민주주의 • 민중 • 반대 • 보수주의 • 부정선거 • 비례대표제 • 사표 • 사회주의 • 상원 •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선거운동원 • 세자(왕세자) • 시민 • 시민단체 • 시위 • 시의원 • 시의회 • 양당제 • 양원제 • 여론 • 여론조사 • 여왕 • 연방의회 • 왕 • 왕비 • 왕자 • 왕정 • 우익 • 우파 • 운동 • 유권자 • 유세 • 의원 •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 의회 • 이원집정부제 • 인민 • 일당제 • 입법 • 입법권 • 입법부 • 입헌군주제 • 장관 • 전제군주제 • 전체주의 • 정권 • 정부 • 정체 • 정치 • 정치력 • 정치인 • 정치체제 • 정치학 • 족장 • 좌익 • 좌파 • 주민투표 • 중도 • 중의원 • 지역구 • 지역주의 • 지지 • 지지율 • 지지자 • 진보 • 집회 • 찬성 • 참의원 • 천황 • 추장 • 출구조사 • 출마 • 친왕 • 캠페인 • 쿠데타 • 탄핵 • 투쟁 • 투표 • 파시즘 • 포퓰리즘 • 폭력 • 표 • 하원 • 합법정부 • 협의 • 합의 • 혁명 • 황제 • 후보
|
|
|
| 정당
|
개혁신당 • 공명당 • 공산당 • 공천 • 공화당 • 구삼학사 • 국민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극좌정당 • 나치당 • 노동당 • 녹색당 • 당규 • 당대표 • 당원 • 당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민주자유당(민자당) • 민주정의당(민정당) • 민주진보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보수정당 •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 복당 • 분당 • 사회당 • 새누리당 •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 • 신한민주당(신민당) • 싱가포르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 야당 • 여당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 은행금융서비스조합 • 일본유신회 • 입헌민주당 • 자유당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 자유한국당 • 전당대회 • 정강 • 정당 • 정의당 • 조국혁신당 • 조선로동당 • 중국공산당 • 중국국민당 • 진보당 • 진보정당 • 창당 • 창당준비위원회 • 출당 • 탈당 • 통일민주당 • 통합민주당 • 평화민주당 • 한국독립당 • 한국민주당(한민당) • 한나라당 • 합당 • 혁신정당
|
|
|
| 외교
|
FTA • WTO • 가맹 • 공사 • 공사관 • 공산권 • 광복 • 괴뢰국 • 교류 • 교섭 • 국경분쟁 • 국가연합 • 국익 • 국제기구 • 국제법 • 국제사회 • 국제연맹 •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 국제질서 • 기피 • 내정간섭 • 대사 • 대사관 • 독립 • 독립국 • 독립선언 • 독립운동 • 독립운동가 • 독립전쟁 • 독립투쟁 • 독트린 • 동맹 • 밀사 • 밀서 • 밀약 • 방문 • 방미 • 방일 • 방중 • 방한 • 병합 • 보호국 • 본국 • 본국소환 • 북방정책 • 분단 • 분단국 • 분리독립 • 분쟁 • 비밀외교 • 비준 • 서방 • 소환 • 속령 • 식민지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외교권 • 외교력 • 외교부 • 외교정책 • 우방 • 위성국 • 유네스코 • 유엔(국제연합) • 자치 • 자치국 • 자치령 • 적국 • 적화통일 • 전쟁 • 정상회담 • 제3세계 • 제후국 • 조공 • 조약 • 종속국(속국) • 종주국 • 중립국 • 책봉 • 체결 • 초치 • 추방 • 친서 • 친선 • 탈퇴 • 통상 • 통일 • 통일부 • 평화 • 평화통일 • 헤게모니(패권) • 협력 • 협약 • 협정 • 회담 • 회원국 • 흡수통일
|
|
|
| 행정
|
공공 • 공공기관 • 공무원 • 공익 • 과 • 과장 • 관청 • 구민 • 국 • 국가기관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장 • 국제 • 국제기구 • 군민 • 균형발전 • 기관 • 기구 • 내각 • 뇌물 • 대사 • 대사관 • 대통령 • 도민 • 동민 • 면민 • 민원 • 민원인 • 민원처리 • 백성 • 부 • 부부장 • 부장 • 부정 • 부정부패 • 부주석 • 부처 • 부통령 • 부패 • 사무 • 사무관 • 사법 • 사법부 • 사익 • 삼권분립 • 서기관 • 수반 • 수상 • 승인 • 실 • 실장 • 연방정부 • 연방제 • 원 • 읍민 • 인가 • 인허가 • 자치 • 자치권 • 자치단체 • 장관 • 정부 • 정부조직 • 정책 • 조약 • 조직 • 주민 • 주석 • 주정부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 • 지방 • 지방관청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 지방정부 • 지역 • 지역주민 • 차관 • 처 • 처장 • 청 • 청렴 • 청렴서약 • 청장 • 총통 • 통치 • 행정 • 행정구역 • 행정구제 • 행정권 • 행정기관 • 행정력 • 행정부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처분 • 행정학 • 허가 • 헌법기관
|
|
|
| 법률
|
가정법원 • 가집행 • 가처분 • 감옥 • 강제집행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수처 • 공익신고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류 • 구속 • 구속집행정지 • 구치소 • 규칙 • 금고 • 기본권 • 기소 • 내부고발 • 노역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명령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호 • 변호사 • 보석 • 보석금 • 불송치 • 사건 • 사건번호 • 사법 • 사법권 • 사법부 • 사형 • 살인 • 상해 • 소송 • 송치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심의 • 심판 • 압수 • 영장 • 원고 • 위증 • 위협 • 유죄 • 재판 • 전과 • 전과자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제헌 • 조례 • 죄 • 중대재해처벌법 • 증거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집행 • 집행정지 • 징역 • 체포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행정법원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훈방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